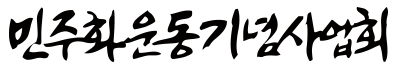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 정호승 시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낮은 곳을 향하여’
글 최규화 (인터파크도서 <북DB> 기자)/ realdem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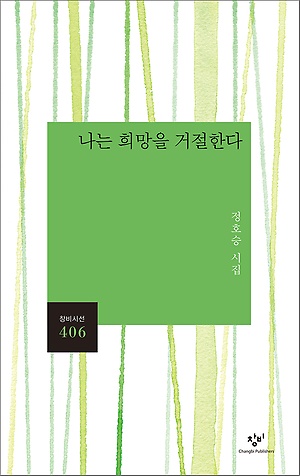
지난 2월, 새 시집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창비)를 출간한 정호승 시인을 만나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다.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인터뷰 전에 약간 건방진(?) 생각을 했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읽어온 정호승인데, 뭐 뻔하겠지.’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새 시집을 읽어봤다. 약간 당황스러웠다. ‘정호승의 시가, 이런 거였나?’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서정시인’이라는 별칭 속에 그를 너무 가둬두고 있었나 보다. 외로움, 기다림, 성찰과 구도 같은 단순한 말로 규정되지 않는, 정호승 시의 새로운 면모가 보였다. 아마도 ‘촛불시민혁명’의 와중에 그의 시를 읽은 터라 더 그렇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세계를 직시하고, 고독과 절망 속에서 사랑의 희망을 다시 움켜쥐려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의 시집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 머뭇거렸다. 그를 손쉽게 ‘보수’라고 구분 짓는 시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글을 쓴 정호승이 보수라면, 박근혜 정권의 검찰에게 기소당한 안도현 시인을 옹호하는 성명에 참여한 정호승은 진보인가. 우익논객 조갑제와 함께 <김현희의 하나님>을 쓴 정호승이 보수라면, 1980년대 민중의 한을 그린 <서울의 예수>를 쓴 정호승은 진보인가. 젊은 날 ‘월간 조선’에서 직장생활을 한 정호승이 보수라면, 세월호 참사 추모시를 쓴 정호승은 진보인가.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의하고 국정원 비판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정호승은 과연 진보인가.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진보-보수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보수 시인이기 때문에 그의 시를 읽지 않겠다는 생각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의 시를 읽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45쪽에 실린 표제시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다. 화자가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고 단호히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희망은 대부분 별 희망 없이 꺾이고 만다. 그것은 그 희망이 절망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망은 절망을 딛고 자라는 열매다. 하지만 우리는 밝은 희망만을 보고 매달리느라, 희망의 토양이 되는 절망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희망을 갈구하는 시인은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라는 역설을 노래한다.
우리는 지난가을부터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그 희망과 절망을 모두 목격했다. 시작은 이 나라의 수준이, 우리 민주주의 존엄이 겨우 이 정도였나 하는 비참한 절망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 있는 희망’이 자라났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절망을 인정하고 희망을 피워올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진정한 희망이 됐다.
정호승 시인을 만났을 때, 촛불시민혁명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시 한 편을 골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를 꼽았다. 시민들이 받은 절망의 상처가 썩어서 옥토가 되고 새로운 싹이 돋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싹에서 민주적 정의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필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적 정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길에, 대통령 선거는 분명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적인 정권을 만들어낸 정당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손을 들고 아웅다웅 하는 중이다. 여전히 “희망이 없는 희망”, “희망만 있는 희망”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보인다. 희망을 참칭하는 절망의 무리들, 허황된 주문 같은 희망만을 되뇌는 거짓 희망들이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있다. 지독한 절망을 겪고 ‘희망 있는 희망’을 만든 우리 시민들은 이제 그런 ‘희망 없는 희망’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낮은 곳을 향하여
첫눈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내린다
명동성당 높은 종탑 위에 먼저 내리지 않고
성당 입구 계단 아래 구걸의 낡은 바구니를 놓고 엎드린
걸인의 어깨 위에 먼저 내린다
봄눈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내린다
설악산 봉정암 진신사리탑 위에 먼저 내리지 않고
사리탑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늙은 두 손 위에 먼저 내린다
강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바다가 되듯
나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인간이 되는데
나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인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아진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도 태백을 떠나 멀리 낙동강을 따라 흘러가도
나의 가장 낮은 곳에 다다르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아진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62~63쪽에 실린 시 ‘낮은 곳을 향하여’를 읽으며, 그동안 우리가 빼앗긴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한다. 우리가 빼앗긴 자유는 슬픔의 자유였다. 눈물의 자유였다. “걸인의 어깨 위”에 따뜻한 외투 한 벌 덮어줄 수 있는 연민의 자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늙은 두 손”에 우리의 작은 손을 포갤 수 있는 연대의 자유였다.
아프고 다친 이들을 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곁에 서서 눈물의 시 한 편 같이 읽지 못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곁에 서서 원통한 노래 한 소절 같이 부르지 못했다. 우리는 슬픔을 빼앗겨왔다. 눈물을 빼앗겨왔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린 이들은 블랙리스트가 됐다. 권력은 시민들의 이름에 검은 칠을 했다. 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회의 ‘선’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촛불시민혁명이 되찾은 것은 슬픔의 자유다. 눈물의 자유다. 이제 낮은 곳으로 함께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껏 울어야 한다.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주인 없는 대권(大權)을 손에 쥐겠다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나온다.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나는, 시민이 되찾아준 고귀한 자유들을 늘 되새기면서 “나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인가”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여전히 찾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