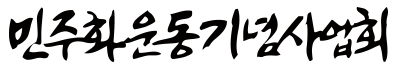나는 ‘사랑’에 투표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에 투표하겠습니다
- 도종환 <당신과 나의 나무 한 그루> <미리내>
글 최규화 (인터파크도서 <북DB> 기자)/ realdemo@hanmail.net

‘장미대선’이라 했다. 그저 장미가 피는 계절에 열리는 대통령선거라는 뜻일 뿐, 장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장미대선이라는 말이 참 민망스럽다. 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을 봤다. 저게 무슨 토론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한 대화들이 오갔다. 성폭행이든 뭐든 지난 일인데 뭐 어떠냐는 ‘놀라운’ 수준의 인간도 있었다. 참고 보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시청한 건, 유권자의 작은 의무감 때문 아니었을까 싶다.
토론이 끝나고, 긴 한숨을 쉬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이미 밤은 늦었고, 한 번 미룬 마감은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애당초 이 글을 쓰기 위해 찾아둔 시가 있었지만 그 시로 눈길이 가지 않았다.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었다. 마음을 닦고 귀를 씻어줄 문장들이 필요했다.
종교를 가진 사람 같으면 ‘말씀’이 담긴 책을 펼쳤을 텐데, 아무 종교도 없는 나는 무엇을 읽을까. 그러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사랑의 시집 앞에 눈길이 멈췄다. 그래, 사랑. 나는 사랑에 귀의하는 것을 선택했다. 31년 전에 나온,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초판이었다. 종이가 바래다 못해 바스러질까 걱정될 정도. 나는 흙속의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다.
당신과 나의 나무 한 그루
노래가 끝나자 바람소리가 크게 오네요
열어둔 창으로 솨아솨아 밀려오는 바람처럼
당신의 사랑은 끊임없이 제게 오네요
가늠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어도
나뭇잎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흔들리며
아주 가까이 당신의 사랑은 제게 와 있어요
어떤 날은 당신이 빗줄기로 나뭇잎을 하루종일 적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거센 바람으로 잎파리들을 꺾어 날리기도 하지만
그런 날 진종일 나도 함께 젖으며 있었고
잎을 따라 까마득하게 당신을 찾아나서다
어두운 땅으로 쓰러져 내리기도 했어요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잔가지에 푸른 잎들 무성히 늘어
빈 가슴에 뿌릴 박고
당신의 하늘 언저리 더듬으며 자라는 나무 그늘에
오늘도 바람은 여전히 솨아솨아 밀려오고
천둥이 치고 마른 번개가 높은 나무끝을 때려도
어둠 속에서 어린 과일들 소리없이 크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사이에 두고
당신과 나의 사랑은 오늘도 이렇게 있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접시꽃 당신>은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시인이 회한과 비탄의 심정을 담아낸 시집이다. 시집의 53~54쪽에 실린 시 ‘당신과 나의 나무 한 그루’는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는지 자문하게 하는 시다.
1차적으로는 이 시의 ‘당신’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가늠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지만, 당신은 늘 “나뭇잎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흔들리며/ 아주 가까이” 온다. “빗줄기”로 “거센 바람”으로 오는 당신은 화자를 진종일 젖게 하기도 했고, “어두운 땅으로 쓰러져 내리”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돼야 할 이유가 있다. “빈 가슴에 뿌릴 박고/ 당신의 하늘 언저리 더듬으며 자라는 나무” 때문이다. 먹먹한 사랑과 시린 그리움을 먹고 자라는 나무. “어둠 속에서 어린 과일들 소리없이 크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그 사랑을 견디게 한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하는가. 왜 손 닿을 수 없는 그 많은 ‘당신’들을 그리워하는가. 바로 그 나무 한 그루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당신’의 여러 얼굴들을 생각해보자. 사랑은 사람의 이름으로만 오지 않는다. 사랑은 연인의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 꼭 숨 쉬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일 필요도 없다. ‘당신’의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는 독자의 마음이다.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간절히 사랑하여, 어떤 나무에, 어떤 과일들을 키울 것인지는 각자의 뜻에 달렸다. 나는 그곳에, 무엇을 놓을까.
미리내
밤새도록 쫓기는 꿈을 꾸었다
밤새도록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 소리쳤다
낮에는 미리내를 다녀왔다
낮게 누운 목잘린 무덤들을 보고 왔다
팔다리를 잃고 온 죽음도 보았고
옳다고 믿는 것 위해 죽었다는 것뿐
이름도 온전한 육신도 남기지 못한
목숨들이 산비탈마다 누워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나의 모가지를 어찌할 것인가
그늘진 골짜기에 이름없는 모가지를 떨구고도
그들의 삶은 오히려 타오르는 희망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가지를 어찌할 것인가
어두운 세월을 은하수처럼 깜빡이며 청산도 흐르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내린 쓴 잔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푸른 칼날을
피하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들도 우리의 고난을 지고 밤마다
피눈물의 저 고개를 넘어야 한다
눈물고개를 넘어온 바람이 미산리 골짝을 쓸고 있다
쫓기지 말고 우리도 바람의 그 앞으로 가야 한다
당당하게 그러나 담담한 걸음으로 그들이 걸어갔듯
우리도 칼날 같은 바람의 그 앞으로 떳떳이 가야 한다.
시집의 책장을 천천히 더 넘기며, 나는 ‘당신’의 자리에 무엇을 놓을지 계속 생각했다. 무엇을 사랑하며, 어떤 나무를 자라게 할지. 시집 111~112쪽에 실린 시 ‘미리내’는 내 마음속에 늘 박혀 있던 ‘가시’ 하나를 건드렸다. “옳다고 믿는 것 위해 죽었다는 것뿐/ 이름도 온전한 육신도 남기지 못한” 그 많은 ‘당신’들 말이다.
시 속에 ‘미산리’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시의 제목이기도 한 ‘미리내’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있는 ‘미리내성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800년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 살던 곳.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묘소를 비롯해 여러 무명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조선은 왕의 나라였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평등을 꿈꾼 이들은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은 평등을 믿었다.
내 마음속에 박혀 있던 가시. 미리내에 묻힌 ‘무명 순교자’들처럼, 민주주의의 성지에 이름 없이 묻힌 사람들. 5월은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순교의 계절이기도 하다. 5월의 광주에는 아직도 장미의 아름다움에 묻혀서는 안 되는 ‘당신’들이 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외침을 남기고 5월의 하늘에 흩어진 목숨들. ‘자신도 피해자’라는 전두환의 회고록에 두 번 세 번 찢기고 짓밟힌 ‘당신’들. “칼날 같은 바람의 그 앞으로” “당당하게 그러나 담담한 걸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자라게 하는지, 어떤 과일을 키우는지.
선거는 정치지만, 정치는 선거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번 대선 역시 온갖 계산과 이른바 ‘선거공학’이 난무한다. 나는 그것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무’를 먼저 생각한다. 그동안 ‘될 놈 찍자’는 마음으로 사표(死票)를 피하려 찍은 표들은, 우리를 죽이고 ‘당신’의 사랑을 해치는 진정한 ‘죽음의 표’로 돌아왔음을 알고 있다. 믿음을 향해 걸어간 미리내의 ‘당신’들처럼, 2017년 촛불이 만든 봄을 사는 “우리도 칼날 같은 바람의 그 앞으로 떳떳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