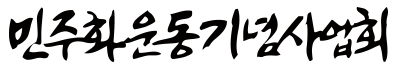2016년의 끝에서 ‘두 남자’를 기억한다
2016년의 끝에서 ‘두 남자’를 기억한다
- 한승헌 시 <어느 제야에> <동토의 아침>
글 최규화 (인터파크도서 <북DB> 기자)/ realdem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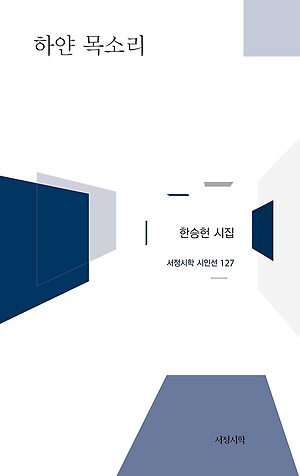
촛불이 외쳤다. 역사가 답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촛불의 함성이 역사를 움직였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남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는 여전히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촛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축제’와 하나가 됐다. 작은 승리의 기쁨은 더 긴 싸움을 위한 의지로 체화된다.
2016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감회와 각오가 여느 해와는 분명 다르다. 때마침 한승헌 변호사의 시집 <하얀 목소리>(서정시학/ 2016년)를 받아든 것은 행운이었다.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아온 그가 거의 반세기(49년) 만에 내놓은 시집. 그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시인이었다. <하얀 목소리>에는 먼저 나온 두 권의 시집 <인간귀향>(1961년)과 <노숙>(1967년)에서 추린 시와, 그 후 여러 지면에 발표한 시들을 함께 묶었다.
시집에 실린 시들은 모두 40편 남짓.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꼭꼭 씹어 넘겼다. 한 젊은 법조인의 양심의 목소리를 읽었다. “사랑을 사랑하는” 지식인의 다부진 결기를 읽었다. 책장을 덮고 나서, 2016년을 마무리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두 남자의 이름으로 모아졌다.
어느 제야(除夜)에
그 많은 아우성과
그 많은 상실을 남기고
너는 갔다.
모래알 같은 우리 생애의 언덕으로
쓰디쓴 행렬은 밀려오는데
소리 없이 역류하던 뜨거운 해일
그 진한 핏방울로 하여
그 억센 분노로 하여
그 다하지 못한 기원으로 하여
아직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야 한다.
가슴과 가슴마다 폭풍이 불어
이만 역사의 노점을 부셔야 한다
인간의 거리와 거리
다함없는 목숨의 노래
여기 얼룩지는 한에 젖으며
또 한 번 해가 바뀐다.
백남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다. <하얀 목소리> 45~46쪽에 실린 시 ‘어느 제야에’의 첫 세 행을 읽자마자 백남기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농민 백남기. 전남 보성에 사는 나이 일흔의 농민은 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지난해 11월 14일 쓰러진 그는 올해 9월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2월 이 지면에 “또 한 번의 봄을, 농사꾼 백남기에게”(https://www.kdemo.or.kr/blog/poem/post/1212)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씨를 뿌리지 못했다. 그해 겨울을 마지막으로, 그의 세상에 또 다른 계절은 오지 않았다.
그가 숨을 거둔 뒤에도 세상은 그를 조용히 보내주지 못했다. 경찰은 그의 사망원인을 규명한다며 부검을 시도했다. 세상이 다 아는 백남기의 사망원인을 ‘가해자’인 경찰만 몰랐다. 유가족들은 저항했다. 물대포로 백남기를 쓰러뜨린 경찰의 손에 시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가족들의 곁에 섰다. 그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있었다.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시민들이 영안실을 지켰다. 한 달이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부검을 포기했다.
‘만약에’라는 생각은 대개, 그런 생각이 별 소용 없을 때 드는 생각이다. 하지만 떨칠 수 없는 생각, ‘만약에 2016년의 촛불이 딱 1년만 먼저 일어났다면’. 2016년 가을에서 겨울까지 백만이 넘는 촛불이 광장을 지켰다. 물대포는 얼씬 하지 못했고, 보수적인 법원마저 청와대 앞 행진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만약 백남기가 싸우던 2015년 11월의 광장에 지금처럼 촛불의 축제가 벌어졌다면. 백만의 촛불이 물대포를 몰아내고 막혀 있던 길까지 뚫린 그곳에 백남기 역시 설 수 있었다면.
부질없는 생각은 지우고, 지금 남은 것들을 차갑게 바라봐야 할 때다. 그가 남긴 “진한 핏방울”과 “억센 분노”와 “다하지 못한 기원”까지. 그가 쓰러지고 난 뒤 1년이 지나, 우리는 이 거리에서 작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봤다. 이 거리에 얼룩져 있는 그의 ‘한’ 역시 씻겨 나갔는지, 우리는 여전히 잊지 말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동토(凍土)의 아침
이 아침엔 나도
수녀가 된다.
피고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기구祈求하는 처소로 나와
어느 원심圓心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부끄러움이 묻히고
뉘우침도 잊어가는
이 연대의 표류 속에
그래도
새 아침의 햇살은 감격이로다.
이제라도 우리들
화폐를 사랑하듯 미치게
정말 소중한 것을 사랑하며
의로운 것에 미치고
사랑을 사랑하며
삼백육십오 일이 한결 같은
새 아침으로 이어가게 하라.
이제 우리는 안다
산다는 것은 마냥
동토에 움이 트는 기다림이며
아픔이며 눈물겨움이라는 것을…
이 기다림을 위하여
아픔을 위하여
눈 덮인 골짜기
그늘진 지층 아래서
한사코 기다리는 목숨의 입자粒子가 있음을…
서울 서소문동 37번지
아우성의 종착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여
복도에 서성대는 표정들이여
어서 당신의 밀실로 돌아가
오오래 잊었던 고해를 하게나.
그리고서
알몸으로 포효하는 열도熱度로 하여
이 해를 가득 채워라
사본寫本 천하
이 우울한 대지에
당신만은 열외에 서라
찬란한 열외에 서라.
두 번째 남자의 이름은 이석기다. ‘동토의 아침’은 <하얀 목소리>의 32~34쪽에 실린 시. “서울 서소문동 37번지”는 옛날 대법원이 있던 곳이다. 아마도 시인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날 아침에 이 시를 쓴 모양이다.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시인은 수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석기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9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의 이름을 듣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진보에게 버림받은 진보니까. 그를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이라는 말을 서두에 꼭 붙여야 했다. 같은 ‘내란범’이 되지 않기 위해, 나 역시 ‘종북’의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그렇게 방어막부터 쳐야 했다.
이석기는 이미 3년 3개월의 형을 살았다. 그가 속해 있던 정당은 2년 전에 강제로 해산됐다. 그래서 묻고 싶다. 아직도 그들의 반론을 들어볼 준비가 안 됐느냐고. 법원의 판단에도 ‘내란음모’는 없었다. 그래서 ‘내란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선동이 있었다’는 어리둥절한 결론을 내렸다. 지하혁명조직이라던 이른바 ‘RO’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였던 ‘합정동 강연’의 녹취록은 450여 군데가 왜곡된 누더기였다. 그마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결정적으로 그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처벌받았다. 실체 없는 내란으로, 행위는 없이 처벌만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다.(한승헌 변호사 역시 그때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한 것은, 김대중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김대중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후에 무기징역으로, 20년형으로 감형됐다. 김대중은 2년 7개월 복역한 뒤 형집행이 정지됐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현재 3년 3개월째 복역 중인 이석기는 김대중의 ‘내란죄 수감’ 기록을 날마다 경신하고 있다.
이석기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이석기에게 동의하진 않지만” 같은 전제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전제를 다는 순간, 우리 역시 감옥에 갇히기 때문이다. “이석기와 같은 생각은 안 돼!”라는 생각의 감옥, “허락받지 않은 생각은 말하면 안 돼!”라는 말의 감옥. 이석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감옥, 말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동토의 아침’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선처를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사랑하며/ 의로운 것에 미치고/ 사랑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소는 “이 우울한 대지에/ 당신만은 열외에 서라/ 찬란한 열외에 서라.”는 것. 2017년이 되면 이석기는 감옥에서 네 번째 새해를 맞이한다. ‘내란 없는 내란범’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땅은 “우울한 대지”다. 당신만은 열외에 서기를. 상식의 땅에 서서 새해를 맞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