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시인, 혁명의시인_신동엽
글·서효인 humanlover naver.com naver.com
|
|
|
|
세계 곳곳은 지금 혁명의 바람이 거세다. 오랜 독재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국민을 억압한 독재자들은 이제야 그 말로를 맞이하거나, 성난 민중에게 끝내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독재자의 싸움은 언제고 시민의 승리로 마감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죽음과 고통도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지금 이곳과는 머나먼 곳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의 바람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헛되지 않기 위해 가야할 길을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이다.
헛되지 않은 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정신이다. 쇠붙이로 행해지는 권력의 폭력에 큰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바로 혁명의 진짜 정신이다. 그리고 이 진짜 혁명의 정신은 많은 민중에게서 종교와 지리를 떠나 아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아우성에 우리 모두는 어떤 기시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 1960년 4월의 하늘 아래, 1980년 5월의 땅 위에서 우리는 혁명의 정신을 나누었고, 내질렀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오래도록 되짚어보게 한 시인이 있다. 4·19혁명의 기시감은 우리에게 한 시인을 소환한다. 바로 신동엽 시인이다.
신동엽 시인은 가난 속에서 자라 전쟁을 통해 병을 얻었고, 혁명 속에서 사랑을 나눴다. 그의 죽음은 전쟁 중에 생긴 병증에 의해서였으나 그의 삶은 혁명 속에서 탄생한 詩로 인해 영원하다. 시인으로 인해 4월은 혁명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시인은 혁명으로 인해 4월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금강 지천의 꽃처럼 만발했던 혁명의 기운은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처럼 열매를 보지 못하고 군사쿠데타로 마감한다. 우리가 아는 4·19혁명은 봄밤의 청량함처럼 짧은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흘리는 혁명성은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한지 모른다. 시인에게 진정한 혁명은 쇠붙이가 아닌,‘ 향기로운 흙가슴’이다. 흙은 영겁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졌고 또한 그만큼의 시간을 제 몸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신동엽 시인은 정성스레 흙을 만지는 농부의 심정으로 혁명의 그날에서 7년이 지난 어느 날‘껍데기는 가라’를 썼다. 적어도 시인에게 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영탄조의 통렬함으로 발설해야만 하는 끈질긴 시감(詩感)이자, 아우성이었던 것이다. |
|
|
|
 신동엽 시인은 충남 부여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930년대 우리민족에게 평범함이란 가난함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했던 시인의 부모님은 역시 우리 민족 어느 누구의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했고, 굶주렸고, 핍박받았다. 곤궁한 현실은 시인에게 민중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결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인의 등단작인‘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신춘문예 당선작에서는 희귀한 장시의 형식을 띄고 있고 필생의 역작인‘금강’으로 본격적인 민족 장시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라는 장르가 민중의 역사와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 신동엽 시인은 전쟁 통에 굶주림에 못 이겨 살아있는 가재를 먹고 병을 얻는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시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었어도 병은 끈질기게 시인을 따라다녔다. 병은 간혹 사라지는 듯했으나 다시 끈질기게 그 신동엽 시인은 충남 부여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930년대 우리민족에게 평범함이란 가난함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했던 시인의 부모님은 역시 우리 민족 어느 누구의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했고, 굶주렸고, 핍박받았다. 곤궁한 현실은 시인에게 민중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결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인의 등단작인‘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신춘문예 당선작에서는 희귀한 장시의 형식을 띄고 있고 필생의 역작인‘금강’으로 본격적인 민족 장시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라는 장르가 민중의 역사와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 신동엽 시인은 전쟁 통에 굶주림에 못 이겨 살아있는 가재를 먹고 병을 얻는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시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었어도 병은 끈질기게 시인을 따라다녔다. 병은 간혹 사라지는 듯했으나 다시 끈질기게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언제나 몸이 아팠던 신동엽 시인에게 유일한 약은 혁명의 기운이었다. 가짜로 점철된 쇠붙이가 아닌 진달래가 피어나는 진짜 우리의 산천이 시인에게는 특효약이었던 것이다.시인에게 이 땅은 진달래가 피고 금강이 흐르는 모성적
자연이기도 했고 고구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쟁과피 흘림이 멈추지 않는 상처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기관포와 같은 쇠붙이의 힘이 아니다. 신동엽 시인은 사랑과 낭만 그리고 미래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하였다. 그리고 시인 본인에게 온 사랑 역시 필연적인 것이었다. 신동엽 시인은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생활을 강구할 방안으로 헌책방을 마련한다. 돈암동에 자리한 헌책방에서 짧은 시인의 삶에 반려자가 되었던 부인을 만나게 된다.‘ 맵찬 눈매를 한 소녀가 가끔 들러 대중잡지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예지 아니면 사상지 그리고 어려운 학술서적만 사가’는 모습에 시인은 마음을 주게되었다.
|
 |
 |
결혼 후에 신동엽은 더욱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다. 물론 평생의 병마가 그를 괴롭혔지만 부여에서의 요양생활 에서 시인은 독서와 창작에 몰두한다. 자연에 대한 사랑, 생명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 등 시의 정서적 근간은 이곳에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이 병을 어느 정도 물리치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무렵 4·19 혁명은 일어난다. 혁명의 가운데서 혁명의 흙을 직접 밟은 신동엽 시인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교육평론사’에서 <학생혁명시집>을 직접 엮어낸다. 그 시집에는 신동엽 자신의 시가 한 편 실려있다. 이 시는 시인이 낸 첫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아사녀’이다. 우리민족 고유의 설화 속 인물을 제목으로 형상화한 것처럼 시인의 인식 속에서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물줄기의 흐름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흐름의 인식은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 나타난다. 독재와 부정에 대한 항거였던 혁명에서 시인은 통일의 염원과 기운을 목도하였고 그 자신도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낭만과 에너지를 시에 쓰기 주저하지 않는다. 「산문시(1)」에서의 중립국은 신동엽 시인이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온 인류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곳은 대통령이나 광부나 농민이 모두 함께 삼등대합실을이용하는 평등한 나라이다. 대통령의 이름보다 새와 꽃의 이름을 먼저 외우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군사기지보다 포도밭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전쟁을 흉내 내며 놀지 않는 나라이다. 이것이 40여 년 전, 시인이 꿈꿔왔던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는 어떠한가. 신동엽의 4월 이후로, 4월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4월속에 살고 있고 곧 새로운 4월을 맞이할 것이다. 어느 4월에 신동엽의 외침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예! 껍데기는 저 멀리 보냈습니다!”라고 말이다. 4월은 그렇게 신동엽을 생각하고 미래의 대답을 상상해 보는 그런 달이다. 저 멀리 뜨거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발밑까지, 시인의 외침은 언제나 유효하다.
|
| 글 서효인 시인, 2006년 계간 <시인세계>로 등단, 시집 『소년 파르티잔 행동지침』이 있다. |
![[시대와 시] 4월의 시인, 혁명의시인_신동엽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4/chapter/images_new_04/chp_06_01.jpg)
![[시대와 시] 4월의 시인, 혁명의시인_신동엽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4/chapter/images_new_04/chp_06_03.jpg)
![[시대와 시] 4월의 시인, 혁명의시인_신동엽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4/chapter/images_new_04/chp_06_0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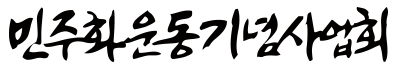

 naver.com
naver.com



![[시대와 시] 4월의 시인, 혁명의시인_신동엽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img/at.gif) naver.com
naver.com![[시대와 시] 4월의 시인, 혁명의시인_신동엽 사진](https://www.kdemo.or.kr/nuri/img_src/201104/chapter/images_new_04/chp_06_02.jpg)